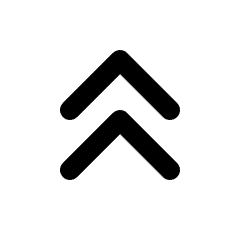송고시간 | 2024-03-23 16:04
 김민기라는 이름을 한국 사회에 알린 '아침이슬'이 그와 33년을 함께 한 대학로 학전소극장의 마지막 노래가 됐다. 지난 3월 14일 오후 7시부터 약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학전 어게인 콘서트'에서 박학기, 권진원, 황정민, 노래를 찾는 사람들, 한영애, 알리, 정동화 등 이날의 출연자들이 함께 마지막 곡으로 부른 이 노래를 들으며 '아침이슬'이 애국가와 같은, 의례곡처럼 들렸다.
김민기라는 이름을 한국 사회에 알린 '아침이슬'이 그와 33년을 함께 한 대학로 학전소극장의 마지막 노래가 됐다. 지난 3월 14일 오후 7시부터 약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된 '학전 어게인 콘서트'에서 박학기, 권진원, 황정민, 노래를 찾는 사람들, 한영애, 알리, 정동화 등 이날의 출연자들이 함께 마지막 곡으로 부른 이 노래를 들으며 '아침이슬'이 애국가와 같은, 의례곡처럼 들렸다.
공식 폐관일을 하루 앞둔 14일 '학전 어게인'의 마지막 공연을 찾았다. 2009년 봄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 참가를 위해 방문한 이후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그때는 별생각 없이 지나쳤던 풍경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입구의 김광석 동상,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복도에 붙어 있는 1990년대의 공연 포스터들을. 개관 초기였던 1991년 4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조동익, 고찬용, 배우 박상원, 변진섭, 윤상, 최성수, 이문세가 출연진이었다. 그 때도 큰 인기를 누리던 이들이 이 작은 무대에 설 수 있었던 당시 한국 대중음악계의 분위기가 새삼 읽혔다.
1995년 갓 데뷔한 윤도현, 댄스 음악 혁명에 밀려 TV에선 볼 수 없던 1997년 박학기의 공연 포스터도 있었다.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들 또한 그 자체로 199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기록지들이었다. 이 과거가 현재였던 때, 나와 그들과 우리가 30년만큼 젊었거나 어렸을 때, 대학로는 한국 공연의 본산지였다. 나는 홍대 앞에서 초기의 인디 밴드들과 어울리며 그 시절을 보냈다. 그때의 밴드들이 홍대앞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으면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열곤 했다. 공연자나 관객이나 신분 상승을 하는 기분이었다.
 댄스 그룹을 제외한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한 번쯤은 거쳐갔던 대학로 소극장의 시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저물었다. 대학로 공연 그 자체였던 연극 공연장이 조금 남아 있을 뿐, 개그 콘서트와 뮤지컬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학전 마지막 날도 대학로 곳곳에서 개그 콘서트 광고와 출연 배우의 얼굴이 크게 걸린 뮤지컬 플래카드만 보였다. 그러니 학전의 마지막 날은 단순히 대학로의 터줏대감이자, 소극장 문화의 상징이 없어지는 걸 넘어 콘서트를 보러 대학로에 가는 마지막 의식이기도 했다.
댄스 그룹을 제외한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한 번쯤은 거쳐갔던 대학로 소극장의 시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저물었다. 대학로 공연 그 자체였던 연극 공연장이 조금 남아 있을 뿐, 개그 콘서트와 뮤지컬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학전 마지막 날도 대학로 곳곳에서 개그 콘서트 광고와 출연 배우의 얼굴이 크게 걸린 뮤지컬 플래카드만 보였다. 그러니 학전의 마지막 날은 단순히 대학로의 터줏대감이자, 소극장 문화의 상징이 없어지는 걸 넘어 콘서트를 보러 대학로에 가는 마지막 의식이기도 했다.
오후 7시, '올드 랭 사인'을 배경으로 깐 영상으로 공연이 시작됐다. "언젠가 이곳이 추억이 될 때면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싶나요?"라는 자막과 함께. 학전으로 오는 길이 과거의 추억을 떠올렸다면, 이날 또한 언젠가 추억이 되리라. 그래서 이날 공연을 더 생생히 머릿속에 남기고 싶었다.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출연자들은 모두 김민기의 노래를 자신들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불렀다. 노찾사는 '철망 앞에서'를, 김민기는 '친구'를, 권진원은 황정민과 함께 '이 세상 어딘가에'를, 정동하는 '천리길'을, 알리는 '바다'를. 여러 장르의 뮤지션들이 부르는 김민기의 노래를 들으며 어쿠스틱 기타 반주로 세상에 나왔던 그의 작품들이 얼마나 다양한 장르로 해석될 수 있는지 새삼 느꼈다. 밥 딜런의 노래가 그러하듯, 김민기는 화두를 던졌을 뿐 해석은 받아들이는 자의 몫이었던 것이다. 메시지뿐 아니라 리듬과 사운드조차도 말이다.
마지막 공연이고 마지막 날이니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다. 김민기 대표의 마지막 인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영애가 '내 나라 내 겨레'를 부를 때 중간에 김민기의 내레이션이 원곡 그대로 나오는 게 그의 육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그렇기에 모든 이들이 학전을 그리워하고 김민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전하는 게 더욱 와닿기도 했다. 권진원이 눈시울을 닦았을 때, 박학기가 "출연자들끼리 오늘 울지 말자고 대기실에서 다짐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세리머니가 아닌 마음으로부터의 환송이자 바람이었다. 마지막이라고 요란떨지 않는, 애써 의미 부여하지 않는, 그저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시작과 끝을 이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